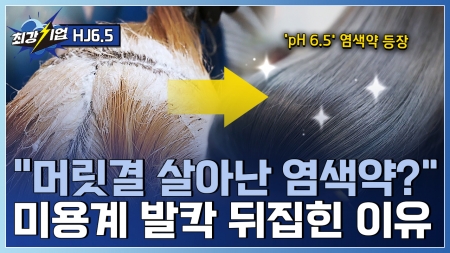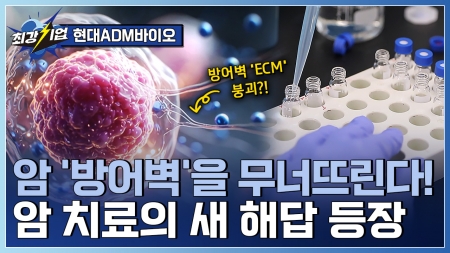[생각연구소] 음악으로 본 심리학의 재발견
2019년 07월 03일 오전 09:00
■ 이동귀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앵커]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골라 듣곤 하는데요. 이처럼 음악은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음악과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앵커]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 뱃속에서 먼저 듣지 않을까 싶은데, 태교 음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태교 음악이 태아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람이 사실 청각을 언제 가지게 되는가를 봤을 때 태어나서 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앵커]
태어난 이후에요?
[인터뷰]
네, 태어난 이후 4개월 정도인데, 그전까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달팽이관 같은 미세 기관들이 발달해야 하니까 2달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음악을 듣지 않는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뭘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기억이 안나니까요. 하지만 태어나기 3개월 전 6개월 지나면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관련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2011년에 캐롤라인 그라니에–데페르 연구팀, 감각지각을 연구하는 분들인데요.
이 연구팀이 임신 35~37주 차 여성들에게 매일 두 차례씩 특정한 피아노 음을 들려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6주가 되었을 때 똑같은 음악을 아이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심장박동수가 이완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차분해진 거죠. 사실 이 피아노 음악이 흔한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은 기억이 없을 거거든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특정한 음악을 뱃속에 있을 때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태아가 뱃속에서 듣던 음악에 반응했다니까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누구나 유년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한두 곡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고 한 노래도 있을 텐데, 청소년기에 들은 음악이나 노래가 청소년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인터뷰]
실제로 연관이 있겠죠? 실제로 범죄학 교수 맥과이어와 스나입스의 연구에 의하면 랩이나 헤비메탈, 이런 특정한 음악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자랄 때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의 결과를 보면 특정하게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것들을 듣게 되면 단기간적으로 공격성이 많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 종단 연구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노래나 아티스트의 어떤 특정한 장르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안좋다고 꼬리표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정서발달에 특별히 나쁜 음악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나잇대에 맞는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폭력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 같은 것, 그건 좋지 않겠죠. 성인들이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요.
[앵커]
저도 학창시절에 발라드나 잔잔한 음악을 좋아했는데, 정서발달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앵커]
성격이 잔잔하신가 봐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 운전할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영국의 리서치 전문업체인 모어댄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17~25세 젊은 운전자 1,000명에게 빠른 템포 곡을 들으며 운전할 때 참가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90%가 운전 중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며 11%는 음악을 듣다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가자의 60%는 "운전 중 듣는 음악의 장르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음악이 빠른 박자가 반복되면 흥분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운전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악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잠재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높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금융 전문 사이트인 컨퓨즈드가 발표한 ‘운전할 때 들으면 위험한 노래’가 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앵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dise City- Guns N' Roses / Walkie Talkie Man- Steriogram♬
[앵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거리고 운전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르게 과속 패달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차가 들썩거릴 것 같죠?
[앵커]
정말 두 곡 다 강렬하고 빠른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곡들은 운전할 때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혹시 운전할 때 도움되는 곡도 있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 심장박동수와 비슷한 속도인 분당 60~80박자 수준의 음악이 좋겠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Coldplay의 The Scientist / Norah Jones의 Come Away With Me♬
[앵커]
노래를 들으니 제가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고, 차분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네요. 이런 노래가 (운전할 때)좋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제 친구 중에 공부할 때 노래 듣는 친구가 있어요.
[앵커]
저도 그래요!
[앵커]
아, 그래요? 저는 공부가 잘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인터뷰]
그게 여러 논란거리인데요. 책 '그리드를 파괴하라'에서 보면 은은한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소음의 데시벨이 중요한데요. 70 데시벨 정도일 때 창의력(인지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면 업무의 정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창의력 점수가 떨어지고, 85dB 이상의 높은 음악을 들으면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록 음악의 경우 120dB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에 전혀 도움이 안되죠.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53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소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저도 공부할 때 잔잔한 팝송 듣기는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혁 앵커와 저처럼 공부를 할 때, 뭔가에 집중할 때 음악을 듣는 게 효과적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사람 성격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성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의 능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음악을 잔잔하게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도 너무 크게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 한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같은 경우 지나치게 음악을 듣게 되면 신나서 음악 듣다가 일에 몰두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혁 앵커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앵커]
각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ASMR, 요즘 많잖아요. 빗소리 들으며 공부해보고 했는데, 저는 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한 데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상황에 따라 음악을 듣는데, 요즘 보니 노년기 치매에는 음악이 도움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혈관성 치매라든지 치매 관련 질환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많이 단절돼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인데, 이런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분들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음악을 통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심리학자 세브린 삼손이 연구해봤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심각하게 언어가 침윤되고, 기억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에 대한 기억만큼은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무의식중에 음악은 각인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지 과정은 침윤을 당해서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음악은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자극을 줄 때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음악은 사람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음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너무 시끄러운 음악 말고요.
[앵커]
네, 잔잔한 음악으로요.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골라 듣곤 하는데요. 이처럼 음악은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음악과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앵커]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 뱃속에서 먼저 듣지 않을까 싶은데, 태교 음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태교 음악이 태아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람이 사실 청각을 언제 가지게 되는가를 봤을 때 태어나서 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앵커]
태어난 이후에요?
[인터뷰]
네, 태어난 이후 4개월 정도인데, 그전까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달팽이관 같은 미세 기관들이 발달해야 하니까 2달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음악을 듣지 않는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뭘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기억이 안나니까요. 하지만 태어나기 3개월 전 6개월 지나면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관련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2011년에 캐롤라인 그라니에–데페르 연구팀, 감각지각을 연구하는 분들인데요.
이 연구팀이 임신 35~37주 차 여성들에게 매일 두 차례씩 특정한 피아노 음을 들려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6주가 되었을 때 똑같은 음악을 아이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심장박동수가 이완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차분해진 거죠. 사실 이 피아노 음악이 흔한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은 기억이 없을 거거든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특정한 음악을 뱃속에 있을 때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태아가 뱃속에서 듣던 음악에 반응했다니까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누구나 유년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한두 곡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고 한 노래도 있을 텐데, 청소년기에 들은 음악이나 노래가 청소년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인터뷰]
실제로 연관이 있겠죠? 실제로 범죄학 교수 맥과이어와 스나입스의 연구에 의하면 랩이나 헤비메탈, 이런 특정한 음악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자랄 때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의 결과를 보면 특정하게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것들을 듣게 되면 단기간적으로 공격성이 많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 종단 연구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노래나 아티스트의 어떤 특정한 장르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안좋다고 꼬리표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정서발달에 특별히 나쁜 음악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나잇대에 맞는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폭력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 같은 것, 그건 좋지 않겠죠. 성인들이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요.
[앵커]
저도 학창시절에 발라드나 잔잔한 음악을 좋아했는데, 정서발달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앵커]
성격이 잔잔하신가 봐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 운전할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영국의 리서치 전문업체인 모어댄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17~25세 젊은 운전자 1,000명에게 빠른 템포 곡을 들으며 운전할 때 참가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90%가 운전 중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며 11%는 음악을 듣다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가자의 60%는 "운전 중 듣는 음악의 장르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음악이 빠른 박자가 반복되면 흥분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운전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악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잠재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높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금융 전문 사이트인 컨퓨즈드가 발표한 ‘운전할 때 들으면 위험한 노래’가 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앵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dise City- Guns N' Roses / Walkie Talkie Man- Steriogram♬
[앵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거리고 운전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르게 과속 패달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차가 들썩거릴 것 같죠?
[앵커]
정말 두 곡 다 강렬하고 빠른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곡들은 운전할 때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혹시 운전할 때 도움되는 곡도 있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 심장박동수와 비슷한 속도인 분당 60~80박자 수준의 음악이 좋겠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Coldplay의 The Scientist / Norah Jones의 Come Away With Me♬
[앵커]
노래를 들으니 제가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고, 차분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네요. 이런 노래가 (운전할 때)좋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제 친구 중에 공부할 때 노래 듣는 친구가 있어요.
[앵커]
저도 그래요!
[앵커]
아, 그래요? 저는 공부가 잘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인터뷰]
그게 여러 논란거리인데요. 책 '그리드를 파괴하라'에서 보면 은은한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소음의 데시벨이 중요한데요. 70 데시벨 정도일 때 창의력(인지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면 업무의 정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창의력 점수가 떨어지고, 85dB 이상의 높은 음악을 들으면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록 음악의 경우 120dB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에 전혀 도움이 안되죠.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53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소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저도 공부할 때 잔잔한 팝송 듣기는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혁 앵커와 저처럼 공부를 할 때, 뭔가에 집중할 때 음악을 듣는 게 효과적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사람 성격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성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의 능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음악을 잔잔하게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도 너무 크게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 한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같은 경우 지나치게 음악을 듣게 되면 신나서 음악 듣다가 일에 몰두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혁 앵커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앵커]
각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ASMR, 요즘 많잖아요. 빗소리 들으며 공부해보고 했는데, 저는 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한 데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상황에 따라 음악을 듣는데, 요즘 보니 노년기 치매에는 음악이 도움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혈관성 치매라든지 치매 관련 질환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많이 단절돼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인데, 이런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분들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음악을 통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심리학자 세브린 삼손이 연구해봤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심각하게 언어가 침윤되고, 기억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에 대한 기억만큼은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무의식중에 음악은 각인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지 과정은 침윤을 당해서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음악은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자극을 줄 때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음악은 사람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음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너무 시끄러운 음악 말고요.
[앵커]
네, 잔잔한 음악으로요.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