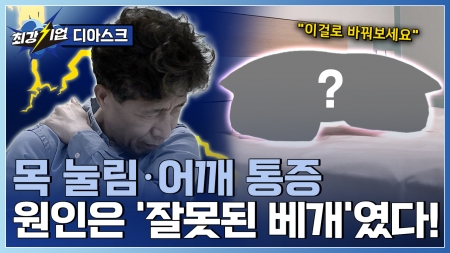[줌 인 피플] 새를 사랑하는 '딱따구리 아빠'…생태작가 김성호
2020년 01월 23일 오전 09:00
[앵커]
여러분은 딱따구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딱딱한 부리로 나무를 쪼는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딱따구리는 새 중에서 산림해충을 가장 많이 잡아먹어서 숲과 나무에 생명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줌 인 피플'에서는 '딱따구리 아빠' 김성호 생태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께서는 새와는 전혀 관계없는 식물생리학을 전공하셨지만, 지금은 딱따구리 아빠 혹은 새 아빠로 불리실 만큼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또 30년 정도 조류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류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인터뷰]
원래 제 전공은 식물생리학입니다. 식물생리학은 식물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저하고는 아주 멉니다. 제가 1991년에 전라북도 남원에 대학이 하나 생겼어요. 문을 여는 대학에 첫 선생이 된다는 설렘 하나로 제가 내려가게 되는데 연구의 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연구하지 못할 형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어서 자연에 길을 묻게 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어서 그 안에 깃든 생명을 내 몸이 장비가 되어 만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는 들꽃, 나무, 버섯 등을 만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것이 새예요. 그런데 가슴에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빛나고 있었나 봅니다. 새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새를 그냥 얼핏 그냥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새를 몇 달씩 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특히 딱따구리를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여 딱따구리 아빠, 새아빠 이런 별명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앵커]
저도 사실 앵무새를 집에서 10년째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마음이 공감되는데 작가님께서 쓰신 첫 번째 책이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고 하더라고요. 딱따구리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품고, 새끼를 낳아서 독립을 시킬 때까지 50여 일의 과정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다고요.
[인터뷰]
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자연에 깃든 생명을 만나 글 쓰고 사진 찍고 했지만 한 17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을 쓰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의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분이 먼저 가신 길을 다 뒤따라가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2007년 4월 6일인데요. 지리산 자락을 더듬다가 막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큰오색딱따구리를 만나게 돼요. 둥지 짓고 알 낳고 품고 어린 새를 키워내는 오랜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마저 또 남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한번 그 사람이 되어보자 해서 둥지 앞에 움막 하나를 짓고 이른 새벽부터 어둠이 올 때까지 그 나무 하나만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고 고맙게 제가 마지막 일정까지 떠나는 그 날까지 다 함께하게 되어서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대가였기에 제 손에 처음 책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이 손에 들리게 됩니다.
[앵커]
작가님이 쓰신 쉽게 보는 저희는 너무 좋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그 둥지 앞에서 딱따구리를 관찰하시는 게 사랑이 없다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왜 하필 딱따구리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인터뷰]
제가 있게 해주신 두 분 중 한 분, 나의 아버지께서는 15세부터 떠나시던 해 80까지 65년을 이 세상의 딱따구리로 살다 떠나셨어요. 목수셨어요. 큰오색딱따구리를 처음 만났을 때, 둥지를 막 짓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의 딱따구리, 저 친구는 숲속의 목수. 좀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다는 마음에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앵커]
나무를 두드리는 딱따구리를 보면서 아버님을 떠올리셨다는 말이 잔잔한 감동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딱따구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딱따구리가 나무를 잘 쪼기로 유명한 새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나무를 쪼는 소리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크게 두 가지 인데요.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 타닥, 타닥, 탁탁탁… 이렇게 쪼는 소리가 있어요. Pec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영어 명칭이 woodpecker고요. 그 소리가 한 장소에서 들리면 정해진 장소에서 들리면 집을 짓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옮겨 다니며 들리면 먹이 활동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연속적으로 쪼는 거고요. 정확히는 두드리는 식이예요. 드르르르르륵, 드르르르르륵… 하거든요. 머리를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어서 쪼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드르르르르륵, 드르르르르륵… 이렇게 들립니다. 그건 드럼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드러밍이라고 불립니다. 드러밍은 자기 영역표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짝을 찾는 소리이기도 해요. 딱따구리의 세상에서는 잘생긴 게 필요 없어요. 드러밍 소리 우렁찬 게 최고입니다.
[앵커]
그런데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다 보면 머리가 아프지는 않을까요? 늘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도대체 집을 짓기까지 딱따구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무를 쪼는가가 궁금했죠. 궁금하면 세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또 하루 종일 세봤죠. 그랬더니 하루에 약 12,000번 정도 쪼아요. 그러니까 1분에 20번 10시간을 지속하면 12,000번이 됩니다. 둥지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두 세 번 부딪히면 바로 뇌진탕이 올 텐데 이 친구들은 괜찮은 게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리와 뇌 사이에 연골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는 비행 때문에 골밀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딱따구리는 골밀도도 치밀하고 위에 부리보다 아래 부리가 살짝 짧아요. 그걸 실험을 해보면 충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몇 가지의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연골 스프링이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굉장히 나무를 쪼기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딱따구리는 부리를 쪼아서 집을 짓는 유일한 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둥지의 목적에 따라서 짓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뷰]
딱따구리의 둥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린 새를 키워내는 번식 둥지가 있고요. 딱따구리는 다른 새와 달리 잠을 꼭 둥지에서 자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전용 둥지가 또 있습니다. 그 새끼를 키워내는 번식 둥지는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꺼운 나무에 짓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고요. 잠을 자는 둥지는 몸만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래서 아주 얕게 팝니다. 번식 둥지는 약 3주 정도 걸리고요. 만드는데. 잠을 자는 둥지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밖에서 봐서 잘 몰라요. 입구는 똑같은 크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넓은 나무에 지었으면 번식 둥지겠다. 가느다란 나무에 지었으면 잠을 자는 둥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그 스스로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기특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만드는 집도 있고 또 잠깐 쉬기 위해서 만드는 집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지은 딱따구리의 집을 탐내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동고비라고요?
[인터뷰]
네, 정확히는 숲에 다른 포유동물조차도 이 딱따구리 집을 엄청 탐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새끼를 키워낼 때는 암수가 확실하게 교대를 해요.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면 뺏기니까.
그중에 동고비라는 새는 참 당찬 친구인데요. 다른 생명들은 딱따구리의 집을 그냥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는 리모델링을 또 해요. 몸집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딱따구리 입구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좁히면 돼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거든요. 이 동고비는 진흙을 물고 와서 그걸 입구를 딱 자기 작은 몸만 간신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좁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딱따구리의 번식 둥지 같은 경우엔 상당히 깊어요. 이 작은 새에게 너무 깊어요. 깊으면 메우면 되죠. 실제 메워요.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축 탑 쌓듯이 바닥을 이렇게 다 높여서 알맞은 높이로 살아가는 아주 당찬 멋진 새가 동고비라고 합니다.
[앵커]
저도 지금까지 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작가님의 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애조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후 작가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터뷰]
제가 27년 대학 선생을 하다가 2년 전에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글 쓰는 사람으로 생태작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볼 수 있는 힘, 들을 수 있는 힘, 느낄 수 있는 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저는 자연 관찰에 온 힘을 쏟으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 내고 싶고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지구별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뭇 생명이 사는 곳이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마음이 세상에 좀 넓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즘 호주 산불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태환경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 지구별에서 딱따구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좀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딱따구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딱딱한 부리로 나무를 쪼는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딱따구리는 새 중에서 산림해충을 가장 많이 잡아먹어서 숲과 나무에 생명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줌 인 피플'에서는 '딱따구리 아빠' 김성호 생태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께서는 새와는 전혀 관계없는 식물생리학을 전공하셨지만, 지금은 딱따구리 아빠 혹은 새 아빠로 불리실 만큼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또 30년 정도 조류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류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인터뷰]
원래 제 전공은 식물생리학입니다. 식물생리학은 식물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저하고는 아주 멉니다. 제가 1991년에 전라북도 남원에 대학이 하나 생겼어요. 문을 여는 대학에 첫 선생이 된다는 설렘 하나로 제가 내려가게 되는데 연구의 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연구하지 못할 형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어서 자연에 길을 묻게 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어서 그 안에 깃든 생명을 내 몸이 장비가 되어 만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는 들꽃, 나무, 버섯 등을 만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것이 새예요. 그런데 가슴에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빛나고 있었나 봅니다. 새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새를 그냥 얼핏 그냥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새를 몇 달씩 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특히 딱따구리를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여 딱따구리 아빠, 새아빠 이런 별명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앵커]
저도 사실 앵무새를 집에서 10년째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마음이 공감되는데 작가님께서 쓰신 첫 번째 책이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고 하더라고요. 딱따구리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품고, 새끼를 낳아서 독립을 시킬 때까지 50여 일의 과정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다고요.
[인터뷰]
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자연에 깃든 생명을 만나 글 쓰고 사진 찍고 했지만 한 17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을 쓰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의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분이 먼저 가신 길을 다 뒤따라가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2007년 4월 6일인데요. 지리산 자락을 더듬다가 막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큰오색딱따구리를 만나게 돼요. 둥지 짓고 알 낳고 품고 어린 새를 키워내는 오랜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마저 또 남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한번 그 사람이 되어보자 해서 둥지 앞에 움막 하나를 짓고 이른 새벽부터 어둠이 올 때까지 그 나무 하나만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고 고맙게 제가 마지막 일정까지 떠나는 그 날까지 다 함께하게 되어서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대가였기에 제 손에 처음 책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이 손에 들리게 됩니다.
[앵커]
작가님이 쓰신 쉽게 보는 저희는 너무 좋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그 둥지 앞에서 딱따구리를 관찰하시는 게 사랑이 없다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왜 하필 딱따구리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인터뷰]
제가 있게 해주신 두 분 중 한 분, 나의 아버지께서는 15세부터 떠나시던 해 80까지 65년을 이 세상의 딱따구리로 살다 떠나셨어요. 목수셨어요. 큰오색딱따구리를 처음 만났을 때, 둥지를 막 짓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의 딱따구리, 저 친구는 숲속의 목수. 좀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다는 마음에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앵커]
나무를 두드리는 딱따구리를 보면서 아버님을 떠올리셨다는 말이 잔잔한 감동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딱따구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딱따구리가 나무를 잘 쪼기로 유명한 새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나무를 쪼는 소리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크게 두 가지 인데요.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 타닥, 타닥, 탁탁탁… 이렇게 쪼는 소리가 있어요. Pec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영어 명칭이 woodpecker고요. 그 소리가 한 장소에서 들리면 정해진 장소에서 들리면 집을 짓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옮겨 다니며 들리면 먹이 활동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연속적으로 쪼는 거고요. 정확히는 두드리는 식이예요. 드르르르르륵, 드르르르르륵… 하거든요. 머리를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어서 쪼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드르르르르륵, 드르르르르륵… 이렇게 들립니다. 그건 드럼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드러밍이라고 불립니다. 드러밍은 자기 영역표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짝을 찾는 소리이기도 해요. 딱따구리의 세상에서는 잘생긴 게 필요 없어요. 드러밍 소리 우렁찬 게 최고입니다.
[앵커]
그런데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다 보면 머리가 아프지는 않을까요? 늘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도대체 집을 짓기까지 딱따구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무를 쪼는가가 궁금했죠. 궁금하면 세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또 하루 종일 세봤죠. 그랬더니 하루에 약 12,000번 정도 쪼아요. 그러니까 1분에 20번 10시간을 지속하면 12,000번이 됩니다. 둥지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두 세 번 부딪히면 바로 뇌진탕이 올 텐데 이 친구들은 괜찮은 게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리와 뇌 사이에 연골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는 비행 때문에 골밀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딱따구리는 골밀도도 치밀하고 위에 부리보다 아래 부리가 살짝 짧아요. 그걸 실험을 해보면 충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몇 가지의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연골 스프링이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굉장히 나무를 쪼기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딱따구리는 부리를 쪼아서 집을 짓는 유일한 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둥지의 목적에 따라서 짓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뷰]
딱따구리의 둥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린 새를 키워내는 번식 둥지가 있고요. 딱따구리는 다른 새와 달리 잠을 꼭 둥지에서 자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전용 둥지가 또 있습니다. 그 새끼를 키워내는 번식 둥지는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꺼운 나무에 짓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고요. 잠을 자는 둥지는 몸만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래서 아주 얕게 팝니다. 번식 둥지는 약 3주 정도 걸리고요. 만드는데. 잠을 자는 둥지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밖에서 봐서 잘 몰라요. 입구는 똑같은 크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넓은 나무에 지었으면 번식 둥지겠다. 가느다란 나무에 지었으면 잠을 자는 둥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그 스스로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기특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만드는 집도 있고 또 잠깐 쉬기 위해서 만드는 집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지은 딱따구리의 집을 탐내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동고비라고요?
[인터뷰]
네, 정확히는 숲에 다른 포유동물조차도 이 딱따구리 집을 엄청 탐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새끼를 키워낼 때는 암수가 확실하게 교대를 해요.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면 뺏기니까.
그중에 동고비라는 새는 참 당찬 친구인데요. 다른 생명들은 딱따구리의 집을 그냥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는 리모델링을 또 해요. 몸집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딱따구리 입구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좁히면 돼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거든요. 이 동고비는 진흙을 물고 와서 그걸 입구를 딱 자기 작은 몸만 간신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좁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딱따구리의 번식 둥지 같은 경우엔 상당히 깊어요. 이 작은 새에게 너무 깊어요. 깊으면 메우면 되죠. 실제 메워요.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축 탑 쌓듯이 바닥을 이렇게 다 높여서 알맞은 높이로 살아가는 아주 당찬 멋진 새가 동고비라고 합니다.
[앵커]
저도 지금까지 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작가님의 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애조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후 작가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터뷰]
제가 27년 대학 선생을 하다가 2년 전에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글 쓰는 사람으로 생태작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볼 수 있는 힘, 들을 수 있는 힘, 느낄 수 있는 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저는 자연 관찰에 온 힘을 쏟으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 내고 싶고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지구별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뭇 생명이 사는 곳이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마음이 세상에 좀 넓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즘 호주 산불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태환경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 지구별에서 딱따구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좀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