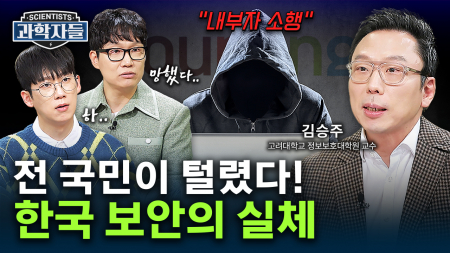[궁금한 이야기] 1초의 역사
2022년 02월 18일 오전 09:00
[앵커]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냐는 시각의 개념!
시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단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든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애초에 아무런 기준도 없었던 자연 상태의 시간을 어떻게 시와 분, 초로 표준화해서 사용하게 됐을까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효종 / 과학유튜버]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시간을 알려주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구 위 어느 곳이라도 전파가 도달하기만 한다면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이 없던 먼 과거에는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들고 다녔습니다.
휴대용 시계의 초창기에는 시계장치 속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는 기계식 시계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수정을 이용한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정시계는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1초를 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밀한 1초“,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1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시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 분, 초 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년, 월, 일 이라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현상을 통한 시간의 단위가 있었죠. 하루는 태양이 뜨고 지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이며, 한 달은 보름달의 모습이 점점 변해 다시 다음 보름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삼았죠.
일 년은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인 정오에서 태양의 고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입니다. 간격이 다를 뿐 모두 시간의 단위들이며, 각각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활동 시간의 근거를, 한 달은 야간사냥 및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일 년은 의식주의 형태를 선택하는 근거를 마련해준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잘게 쪼갠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이용해, 하루라는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 동안 태양이 뜨고 지는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태양 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로 시간을 나눈 것인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그림자의 궤적이 만드는 곡선을 특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하루를 손쉽게 나눌 수 있었죠.
이때 사용한 학문이 기하학이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은 하늘 즉, “천체”의 움직임이었고, 천체는 하늘 위의 돔처럼 생긴 가상공간인 천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기하학을 통해 파악한 천체의 주기 운동을 기준삼아, 하루가 24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달이 보름달일 때를 기준으로, 12시인 정오에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24시인 자정에는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시간의 기준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해 시, 분, 초가 등장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단위를 다시 60등분 하여 “분”, 그리고 1분을 다시 60등분 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1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한 기하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기하학과 자연현상을 통한 시간 측정의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개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야만 기준을 찾을 수 있었던 해 시계는, 모래의 낙하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그릇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등을 만드는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기 직전까지, 이 정도의 도구만으로도 하루 동안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함 없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정밀한 형태의 시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부활과 함께 도래한 과학 혁명기에 의해, 시계는 혁명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학 혁명기를 이끈 서양의 과학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을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는 무게를 가진 추의 왕복운동이, 항상 일정한 주기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무수한 관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공학적으로 활용해, 역사상 최초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계, 진자시계를 개발합니다. 이는 공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계식 시계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형태의 시계들도 등장했습니다. 진자가 일정하게 진동하려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시계가 고정돼 있어야 했는데요. 따라서 선상 위와 같은 흔들리는 곳에서는 진자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죠.
대항해시대 이후, 서양 열강은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바다 위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영국의 시계 제작자였던 존 해리슨이 흔들림의 영향과는 무관한 해상용 시계인 크로노미터를 제작했습니다. 영국은 이 시계를 이용해 해상에서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드넓은 대양에서 배가 어느 경도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항해술의 발달과 해상 영역의 확장에 큰 도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이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 그 위세를 떨치며, 소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수 있었죠.
산업혁명의 도래와 전기문명의 발달 등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히는 물리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정확한 시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오랜 시간동안,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과학자들과 시계공들은 더 정밀하고, 더 오랫동안 일정하게 반복하는 물체를 찾으려했습니다.
쉽게 말해 1초 동안 일정하게, 많이 진동할 수 있는 물체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 이유는 진동 횟수가 많을수록 1초를 측정할 정밀도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이인 1m를 재더라도, 눈금 당 10cm짜리 자로 재는 것 보다 눈금 당 1mm짜리 자로 재는 것이, 더욱 정밀하게 1m를 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 찾게 된 것이 수정 조각이었습니다.
수정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1초 동안 약 32768번 흔들리는데, 이 수정을 시계 내부에 넣고 수정이 32768번 흔들릴 때마다 1초가 흐르도록 만든 시계가 바로 수정시계, 다른 말로 쿼츠 시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진동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세슘 원자 안에서 진동하는 전자를 통해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원자 속 전자의 진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자시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바로 이 원자시계입니다. 세슘 원자 내의 전자의 진동은 수정 조각과 차원이 다르게 빠른데, 그 횟수는 무려 초당 91억 9263만 1770번입니다. 진동 횟수가 몇십억번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론적으로, 원자시계의 1초는 약 30만년동안 겨우 1초 정도의 오차만 발생할 수준으로 정확하답니다.
우리가 언제에 머무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간. 이 시간의 측정 기준은 천체들의 일주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시계를 볼때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1초는, 매일 아침 우리들을 환하게 맞아주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득 메워주는, 저 우주 너머의 천체들로부터 왔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기봉 (kgb@ytn.co.kr)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냐는 시각의 개념!
시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단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든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애초에 아무런 기준도 없었던 자연 상태의 시간을 어떻게 시와 분, 초로 표준화해서 사용하게 됐을까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효종 / 과학유튜버]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시간을 알려주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구 위 어느 곳이라도 전파가 도달하기만 한다면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이 없던 먼 과거에는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들고 다녔습니다.
휴대용 시계의 초창기에는 시계장치 속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는 기계식 시계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수정을 이용한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정시계는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1초를 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밀한 1초“,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1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시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 분, 초 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년, 월, 일 이라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현상을 통한 시간의 단위가 있었죠. 하루는 태양이 뜨고 지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이며, 한 달은 보름달의 모습이 점점 변해 다시 다음 보름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삼았죠.
일 년은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인 정오에서 태양의 고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입니다. 간격이 다를 뿐 모두 시간의 단위들이며, 각각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활동 시간의 근거를, 한 달은 야간사냥 및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일 년은 의식주의 형태를 선택하는 근거를 마련해준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잘게 쪼갠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이용해, 하루라는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 동안 태양이 뜨고 지는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태양 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로 시간을 나눈 것인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그림자의 궤적이 만드는 곡선을 특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하루를 손쉽게 나눌 수 있었죠.
이때 사용한 학문이 기하학이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은 하늘 즉, “천체”의 움직임이었고, 천체는 하늘 위의 돔처럼 생긴 가상공간인 천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기하학을 통해 파악한 천체의 주기 운동을 기준삼아, 하루가 24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달이 보름달일 때를 기준으로, 12시인 정오에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24시인 자정에는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시간의 기준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해 시, 분, 초가 등장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단위를 다시 60등분 하여 “분”, 그리고 1분을 다시 60등분 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1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한 기하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기하학과 자연현상을 통한 시간 측정의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개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야만 기준을 찾을 수 있었던 해 시계는, 모래의 낙하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그릇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등을 만드는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기 직전까지, 이 정도의 도구만으로도 하루 동안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함 없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정밀한 형태의 시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부활과 함께 도래한 과학 혁명기에 의해, 시계는 혁명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학 혁명기를 이끈 서양의 과학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을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는 무게를 가진 추의 왕복운동이, 항상 일정한 주기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무수한 관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공학적으로 활용해, 역사상 최초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계, 진자시계를 개발합니다. 이는 공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계식 시계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형태의 시계들도 등장했습니다. 진자가 일정하게 진동하려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시계가 고정돼 있어야 했는데요. 따라서 선상 위와 같은 흔들리는 곳에서는 진자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죠.
대항해시대 이후, 서양 열강은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바다 위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영국의 시계 제작자였던 존 해리슨이 흔들림의 영향과는 무관한 해상용 시계인 크로노미터를 제작했습니다. 영국은 이 시계를 이용해 해상에서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드넓은 대양에서 배가 어느 경도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항해술의 발달과 해상 영역의 확장에 큰 도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이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 그 위세를 떨치며, 소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수 있었죠.
산업혁명의 도래와 전기문명의 발달 등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히는 물리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정확한 시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오랜 시간동안,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과학자들과 시계공들은 더 정밀하고, 더 오랫동안 일정하게 반복하는 물체를 찾으려했습니다.
쉽게 말해 1초 동안 일정하게, 많이 진동할 수 있는 물체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 이유는 진동 횟수가 많을수록 1초를 측정할 정밀도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이인 1m를 재더라도, 눈금 당 10cm짜리 자로 재는 것 보다 눈금 당 1mm짜리 자로 재는 것이, 더욱 정밀하게 1m를 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 찾게 된 것이 수정 조각이었습니다.
수정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1초 동안 약 32768번 흔들리는데, 이 수정을 시계 내부에 넣고 수정이 32768번 흔들릴 때마다 1초가 흐르도록 만든 시계가 바로 수정시계, 다른 말로 쿼츠 시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진동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세슘 원자 안에서 진동하는 전자를 통해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원자 속 전자의 진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자시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바로 이 원자시계입니다. 세슘 원자 내의 전자의 진동은 수정 조각과 차원이 다르게 빠른데, 그 횟수는 무려 초당 91억 9263만 1770번입니다. 진동 횟수가 몇십억번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론적으로, 원자시계의 1초는 약 30만년동안 겨우 1초 정도의 오차만 발생할 수준으로 정확하답니다.
우리가 언제에 머무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간. 이 시간의 측정 기준은 천체들의 일주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시계를 볼때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1초는, 매일 아침 우리들을 환하게 맞아주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득 메워주는, 저 우주 너머의 천체들로부터 왔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