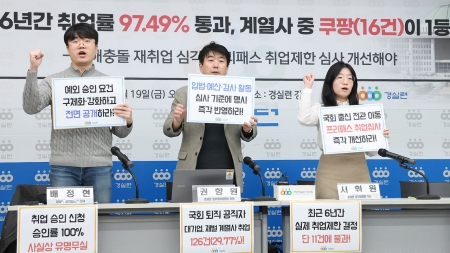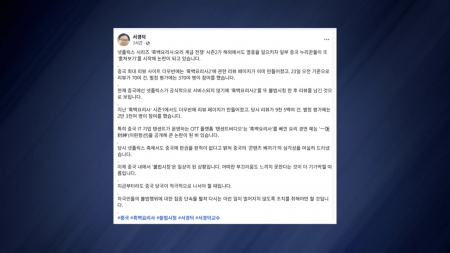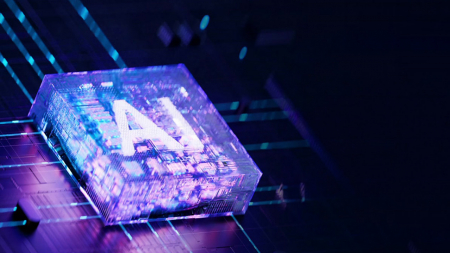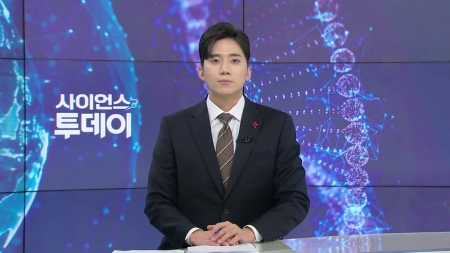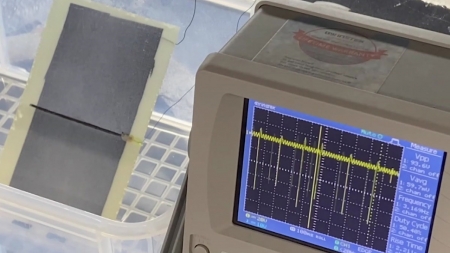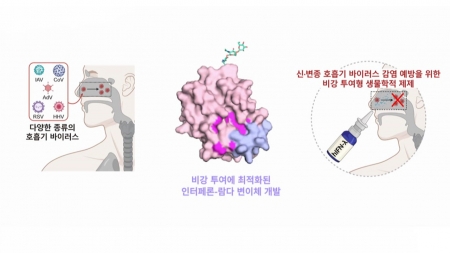[과학1열]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연구성과 장기적 안목 필요"
2025년 09월 02일 오전 09:00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EKC 2025'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연구와 산업화의 징검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다소 생소한데요.
이 대회는 말 그대로 한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0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이후 해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과학기술인협회가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내 8개 한국과학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유럽 내 한인 과학자 사회에서는 가장 큰 학술대회입니다.
[앵커]
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연구와 산업의 징검다리, 쉽게 말해 연구성과의 산업화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이 대회가 열린 장소가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모짜르트 등 클래식 음악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넘게 배출한 기초연구 강국이기도 한데요.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 과학자들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은 탄탄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을 사회의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만욱 /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 (빈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성장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을 기다려서 성과를 기다립니다.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결과를 바라지 않고 최소 5~6년까지는 기다려주고 결과는 기다리는 거죠. 과학기술 정책은 100년이나 요즘 같으면 100년은 너무 길지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깐 연속성이 없지 않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구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년은 기다린다, 이런 설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기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다음 과제를 또 따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유럽의 인내하는 연구 문화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기다림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어떤 의견이 제시됐나요?
[기자]
이 대회가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잖아요.
유럽은 잘 알려졌듯이 기초연구의 역사가 이미 200년이 넘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역사를 길게 잡아야 50년에 불과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200년의 기초 연구 역사를 가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국제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 주목했는데요.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럽에서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대회에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연구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초과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의공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 세션이 진행됐는데요.
의공학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의학으로 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의 한 발표자로 임형순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도 참여했는데, 임 교수는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체내 물질을 활용한 최신 암 조기 진단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최신 암 조기 진단법 개발과 관련해 임 교수는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임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순 /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 : 의학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의사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하버드 의대의 경우 많은 기초 과학자나 저 같은 엔지니어를 많이 교수로 뽑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과학자와 공학자와 의사들이 같이 팀을 이뤄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려면 과학자도 필요하고 화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을 공부한 사람, 약학을 공부한 사람, 심지어 물리를 공부한 사람, 저같이 엔지니어를 전공한 사람, 다 같이 어우러져야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임 교수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의 연구협력, 이른바 다학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지경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앵커]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EKC 2025'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연구와 산업화의 징검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다소 생소한데요.
이 대회는 말 그대로 한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0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이후 해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과학기술인협회가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내 8개 한국과학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유럽 내 한인 과학자 사회에서는 가장 큰 학술대회입니다.
[앵커]
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연구와 산업의 징검다리, 쉽게 말해 연구성과의 산업화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이 대회가 열린 장소가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모짜르트 등 클래식 음악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넘게 배출한 기초연구 강국이기도 한데요.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 과학자들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은 탄탄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을 사회의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만욱 /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 (빈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성장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을 기다려서 성과를 기다립니다.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결과를 바라지 않고 최소 5~6년까지는 기다려주고 결과는 기다리는 거죠. 과학기술 정책은 100년이나 요즘 같으면 100년은 너무 길지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깐 연속성이 없지 않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구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년은 기다린다, 이런 설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기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다음 과제를 또 따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유럽의 인내하는 연구 문화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기다림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어떤 의견이 제시됐나요?
[기자]
이 대회가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잖아요.
유럽은 잘 알려졌듯이 기초연구의 역사가 이미 200년이 넘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역사를 길게 잡아야 50년에 불과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200년의 기초 연구 역사를 가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국제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 주목했는데요.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럽에서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대회에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연구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초과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의공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 세션이 진행됐는데요.
의공학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의학으로 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의 한 발표자로 임형순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도 참여했는데, 임 교수는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체내 물질을 활용한 최신 암 조기 진단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최신 암 조기 진단법 개발과 관련해 임 교수는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임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순 /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 : 의학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의사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하버드 의대의 경우 많은 기초 과학자나 저 같은 엔지니어를 많이 교수로 뽑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과학자와 공학자와 의사들이 같이 팀을 이뤄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려면 과학자도 필요하고 화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을 공부한 사람, 약학을 공부한 사람, 심지어 물리를 공부한 사람, 저같이 엔지니어를 전공한 사람, 다 같이 어우러져야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임 교수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의 연구협력, 이른바 다학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지경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